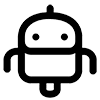'생활의 달인' 이라는 이름으로 손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방송에 소개가 많이 된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젊은 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배우는 것이다.
즉, 그들 만이 하실 수 있는 직업이다.
이 분들이 나이가 들면 결국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들고(S1→S2), 이런 명맥이 끊기면 어쩌지 걱정한다. 그 상품이 계속있는 순간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실생활용어로 '사람구하기 어렵다', '이런 일, 젊은 애들이 안해' '우리나 이런일 하지' 라고 하시기도 한다. (①)

때로는 이러한 말씀속에는 진정한 걱정도 있지만, 또 달리 얘기해보면 새로운 인력의 공급이 안되서 자신들을 찾아준다는 그런 느낌도 든다. 장인들이 나이들어서 은퇴하시니 값어치는 높아지신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경쟁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이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D1→D2), 남아있는 기존 인력이 받으시는 인건비도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존 정도의 수준은 받게 되신다.
이 분 들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인력이 줄어서 오른 효과가 있어서 크게 힘든 부분이 아닐 수가 있으며,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정책은 이분들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되고 결국 이분 들의 가격 또는 명성만 언론에서 다루어주고 경제에는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류의 지원사업이 정말 많다. 일이 어렵고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자고 한다. 정말 그럴까? 그분들의 손기술을 젊은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이전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고민이 필요하다. 즉, 공급도 늘고, 수요도 느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장비들도 좋아지고 있고, 개인 작업용으로 출시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500만원 내외로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 같다.
젊은 장인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러한 시장들에서 두각을 내보기를 바란다.
결국 미래에 남는 직업은 인간의 독창성을 살리면서도, 정형화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성을 요구하는 직업만이 남는다면, 결국 개인의 취향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과 이들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가장 미래 지향적인 직업이지 않을까?